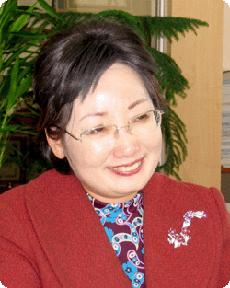 ��� 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
��� 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
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ų�, ������ �ų�, ������ �ٸ� ���� �λ��̶�� �츮�� �� �λ��� ��� ��ư��� �ұ��?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Į���Ͻ�Ʈ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 ͺ 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̿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̴�. ��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. 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�� ã�ų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ü�� ���̴�.
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 �ǹ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δ� �ְ����� ���Ѵ�. 1978�� ����Ǵ븦 �����ϰ� �� ���װ� ���� ���Ǽҿ� ������ �Ǿ��ٰ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Ǽҿ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ǻ簡 �� ���� �и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־��µ� �ǻ���� �ʹ� ���� ���ǻ���� �����ϴ� ��ó�� �����١��� �ߴ�. ������ �ý������ν��� ���ǼҴ� �ǻ��η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Ȳ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ϵ��� �Ǿ� �־��١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״�.
�� ���� �ڽ��� ���ʹ��� �ڿ������ԡ� ���Ǽҿ� �����ϰ� �Ǿ��ٰ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Ƿ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ҽ��� �и�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 �ִ�. �ռ� 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ư���, ���� �츮�� ��� ��ƾ� �ұ�. 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Ŵ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ʴ� ����, ���� �Ѿ� �̿��� �����ϴ� ���ǡ����� ��ġ�� �ϱ��� �ش�. �״ÿ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鿡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ü�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±Ⱑ �帣�� ��ȸ�� ������ �Ѵٴ� ���� ���̴�.
�������Ƿ�� ���� �ٸ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Բ� �ּ��� ���ؾ߸� ȯ�ڿ��� ���� �̹����� �� �� �ִ� �����١�,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ƴ϶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۵ǰ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ȭ�ϴ� ��찡 ���ٴ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Ƿῡ �����ϴ� 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θ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־�� �Ѵ١�, �������̶�� �η��� dz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�ٹ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ǼҺ��ٴ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ʾҳ� �ϴ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 �Ϸ��� �Ѵ١�, ������ ��� ȿ������ �ִ��� Ȱ���ϰ� �ִ�.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å�� �Ͽ� ������ �ϰ�, ������ �κ��� ��Ȱ�� ����� �� �ֵ��� ���� �ִ� ������ �� �ӡ��̶�� ��. 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ִ� ��Ȱ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ʾ� �ξ� �����. 30���� ���Ǽҿ��� �ٹ��ϸ鼭 �������Ƿᰡ �ǻ縸�� ���� �ƴ϶� �ٸ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Ͽ� �����ؾ߸� ��ǰ���� ���� â��ȴٴ� ���� �˰� �Ǿ��١��鼭 ���Բ� ���ϴ� ������ ��̰� ���θ� ����ϸ鼭 ���ϴ� �͡��� �ٸ� ������ �켱�ؼ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ٰ� �ߴ�.
�ֹε��� �����ϰ�, �����ϰ� ���ǼҸ� ã�� �� �ֵ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츲�ϵ��̡� ���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ϴ� ��, �װ�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־��� ���� �ȿ��� �ּ��� ���Ѵ١��� �ų��̴�. �̷��� �Ѱᰰ�� ������ �ϻ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٤���̴�.
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Ǽҿ��� 1980����� ���ݱ��� ����ƿ��鼭 �����ֹε��� �ǰ� ������Ʈ�ν��� ���ҿ� ����� �Դ١��鼭 �����۱����ǼҰ� �̷��� ��ǰ���� �����Ƿ� ��ǰ�� �����ϴ� �ֹΰǰ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ڸ� �ű� �DZ⸦ �ٶ��١��� ������. �츮�� �� �λ��� ��� ��ƾ� �ұ�? �� ������ ã�� �������Ӵ����̴�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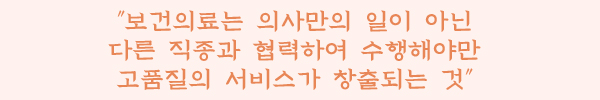
-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å�� ���� ���ش�?
��ȿ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�α���������å��
������ �ΰ� �ִ� ���ǻ������ Ż���Ͽ� �پ��� ��å�� �����ϰ� �����ϴ� ���� �ſ� �ٶ����ϴ�. 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Ǽ��� ��� �ֹε��� �ǰ��屸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ý����� ��ȭ�� �����ϱ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ʾ� ���ο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ִ�.
���Ǽ� �ý����� ��ȭ�� ���� �䱸�� 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μ��� ���� �μ��� �и� ������ν� �ξ� ��Ȱ�� �ý�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δ�. -������ȯ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ҽ���? ��������ȯ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Ƿ� ���� ���ٿ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ȸ�� ȯ�溯ȭ�� �켱�Ǿ�� �� ���̴�.
������ȯ �� ������, �索���� �ΰ� �ִ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���Ǿ�� �Ѵٴ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ؾ������, ȯ�� �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ȯ�ڶ�� �ν��� �����Ƿ� ��Ȱ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ʴ� ��찡 ����. ġ������ �ǻ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ϴ� ��ʸ� ���� ���µ� ������ȯ�� ���� ���DZ����� �嵵 ���� ȯ���� ��̸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���Ǿ�� �ϰ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ȯ�� �ذ��� 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ȸ ��ü�� �ν��� �䱸�ȴ�. �̸� ���ؼ��� ȫ����ü�� Ȱ���� �ʼ����̶�� �����Ѵ١�
Ȳ�� �³�����/hbs5484@hanmail.net
�� �������/uonlyfor@hanmail.net